안녕하세요? 일랑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IT, 문과생이 부드럽게 구워드릴게요!
"책 팔던 회사가, 어느 날 세계 최대 IT 기업이 됐다?"
한때 단순한 온라인 서점이었던 아마존(Amazon)은 지금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AWS(Amazon Web Services)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아마존 같은 유통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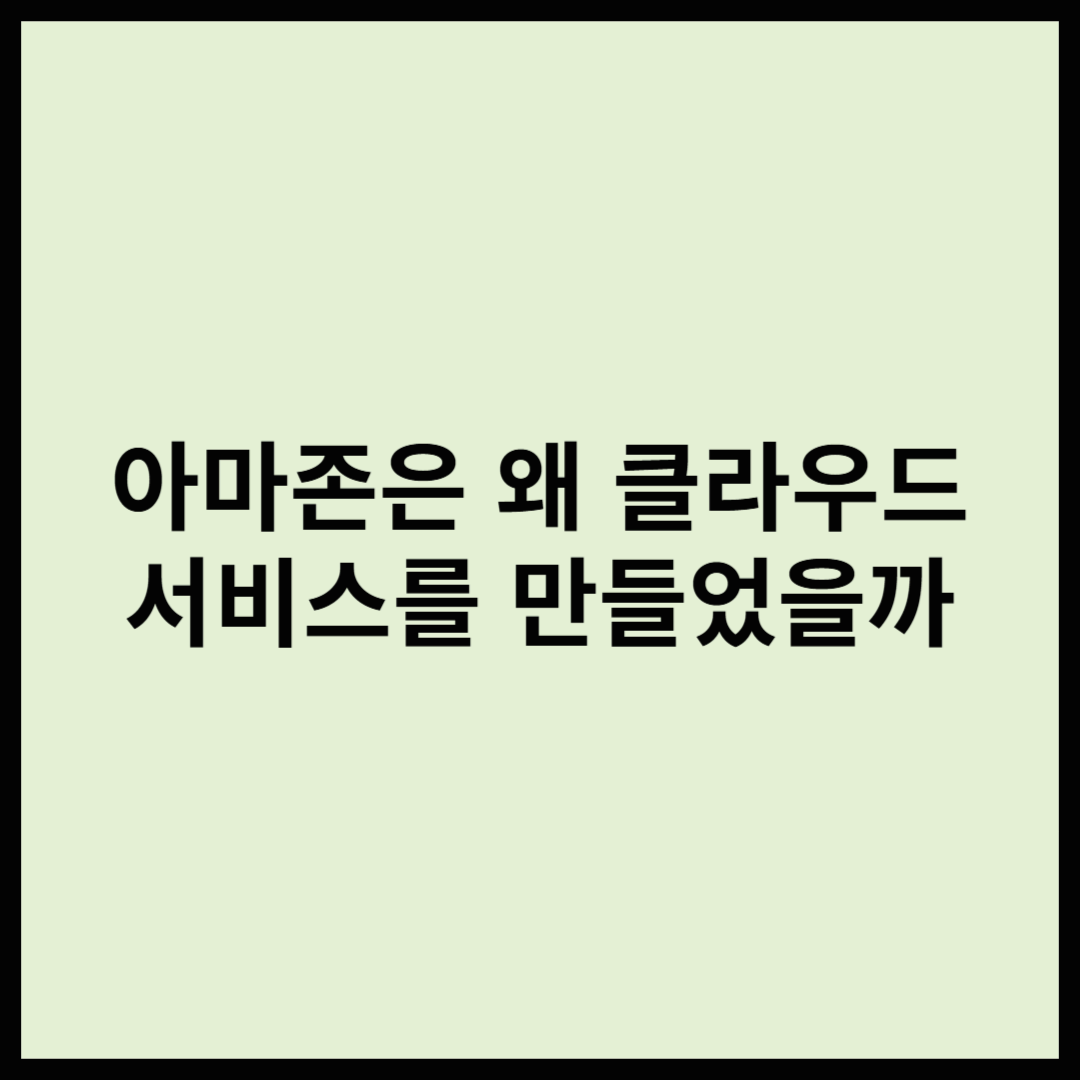
목차
1. 아마존이 겪은 문제, IT 인프라의 비효율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발 속도가 느리고,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예를 들어, 단순한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다른 시스템과 겹쳐서 일주일 넘게 걸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때 아마존이 깨달은 건 하나였죠.
“우리는 개발자가 코드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즉, IT 인프라를 유연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은 내부용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다른 기업도 필요로 할 수 있겠다”는 발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2. AWS의 시작, 내부 시스템이 외부 서비스가 되다
2006년,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Amazon Web Services(AWS)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 Amazon S3 (Simple Storage Service)
→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 Amazon EC2 (Elastic Compute Cloud)
→ 서버를 빌려서 원하는 만큼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Amazon RDS, Lambda, CloudFront 등
→ 점차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아마존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필요한 만큼만 빌려쓰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게 바로 지금의 AWS 모델의 근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마존은 처음부터 “클라우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다 우연히 시장의 수요를 발견했다는 점인 것이죠.
3.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다,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
2000년대 중반부터 IT 스타트업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자본이 부족했고, 서버 구매는 큰 부담이었죠.
✔ 서버 1대 구매 비용: 수백만 원
✔ 유지보수, 네트워크, 백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
그런데 AWS를 사용하면?
✔ 필요한 만큼만 서버를 빌려 쓰고
✔ 자동 백업과 확장까지 가능하며
✔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0원
이 접근 덕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AWS를 채택했고, AWS는 ‘스타트업의 인프라 근간'이 되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성공해 기업이 될수록, AWS는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랍니다.
4. 왜 다른 기업보다 아마존이 먼저 했을까?
그런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술 기반의 기업도 많았는데, 왜 유통 회사인 아마존이 가장 먼저 클라우드를 시작하고 성공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술은 있었지만, 실행한 건 아마존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IT 인프라를 외부에 빌려주는 걸 리스크로 봤지만, 아마존은 '우리가 겪은 불편을 다른 기업도 겪고 있다'고 판단
2. 초기 수익보다는 경험과 확장에 집중
AWS는 초기에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다양한 산업군을 빠르게 장악하며 노하우를 쌓음
이렇게 AWS는 시간이 흐르며 스타트업뿐 아니라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사용하게 되면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5. AWS 서버는 어디에 있을까?, 리전(Region)의 개념과 위치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치 인터넷 상의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곳곳에 물리적인 서버가 존재하다는 건 예전 포스팅에서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AWS 역시 전 세계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Data Cen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들을 그룹으로 나눠 둔 것이 바로 ‘리전(Region)’이에요.
🔹리전(Region)이란?
리전(Region)은 AWS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구축한 물리적 서버 인프라 그룹을 의미합니다. 각 리전은 하나 이상의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 AZ)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용 영역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리전”은 서울 내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2~3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AZ)를 포함하고, 이렇게 분산시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데이터 센터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 왜 리전이 중요할까?
✅ 사용자는 가까운 리전을 선택해
✔ 빠른 응답 속도
✔ 데이터 주권(국가 내 보관)
✔ 지연 없는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다.
✅ 글로벌 기업은 여러 리전에 걸쳐
✔ 백업 & 재해 복구(DR)
✔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2025년 기준 AWS 리전 현황 (일부 예시)
| 리전 이름 | 위치 |
| Asia Pacific (Seoul) | 대한민국 서울 |
| Asia Pacific (Tokyo) | 일본 도쿄 |
| Asia Pacific (Singapore) | 싱가포르 |
| US East (N. Virginia) | 미국 버지니아 |
| US West (Oregon) | 미국 오리건 |
| Europe (Frankfurt) | 독일 프랑크푸르트 |
| Europe (London) | 영국 런던 |
| South America (São Paulo) | 브라질 상파울루 |
| Middle East (UAE)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등 |
| Africa (Cape Town)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AWS는 현재 30개 이상의 리전과 100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신규 리전(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추가 중입니다.
📌 국내 사용자에겐 ‘서울 리전’이 핵심!
AWS는 2016년부터 서울 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카드,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기업들도 이 리전을 이용 중입니다. 공공기관·금융기관도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 서울 리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은 내부적인 업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다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위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AWS가 아마존 전체 매출의 70% 이상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된 만큼, 클라우드는 더 이상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과생이 들려주는 IT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앱테크, 앱으로 소소하게 돈 버는 방법 (0) | 2025.04.13 |
|---|---|
| IDC는 어떻게 생겼을까? (0) | 2025.04.06 |
| 안심번호 서비스,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0) | 2025.04.05 |
| 그룹웨어, 회사의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0) | 2025.03.30 |
| Intel은 왜 흔들리고 있는가 (0) | 2025.03.19 |
| POS,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다 (0) | 2025.03.17 |
| CPU 스펙, 어떤 걸 체크해야 할까? (0) | 2025.03.16 |
| 인트라넷은 왜 탄생했을까? (0) | 2025.03.12 |



